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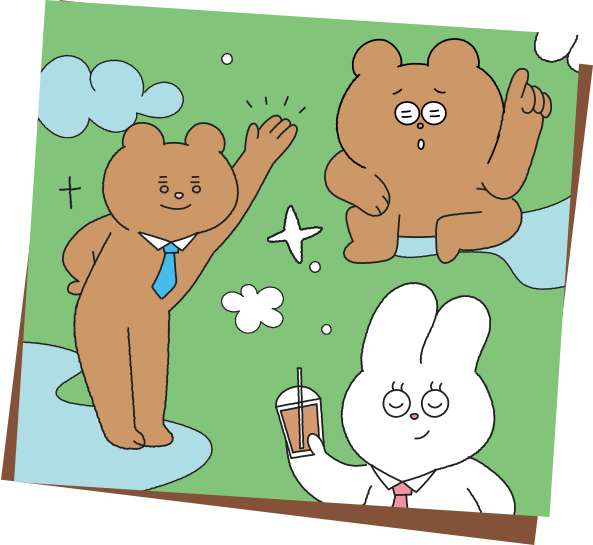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 회사 단톡방에서,
혹은 보고서 창을 열기 직전에도 우리는 ‘짤’ 하나로 웃고 공감한다.
업무의 무게를 잠시 덜어주는 그 한 장의 이미지,
‘직장인 밈’은 이제 현대인의 일상 언어이자
심리 방패막이로 자리 잡았다.
글. 차유미
자료. 2024 잡플래닛 ‘직장인이 공감하는 밈’ 설문 외
‘밈(Meme)’은 1976년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서 제시한 개념으로, 도킨스는 유전자가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듯, 문화적 정보도 모방(imitation)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그리스어 ‘mimeme(모방되는 것)’에서
따와 ‘meme’이라 명명했다. 그러다 인터넷 시대에 들어 ‘밈’은 짧고 반복적으로 소비되며 공감과 웃음을 전파하는 온라인 콘텐츠가 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방송 캡처 이미지에 자막을 얹은 ‘짤’로 발전했고, 오늘날 ‘짤’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 ‘감정을 대신 전하는 언어’로 쓰인다. 피곤함, 짜증, 체념 같은 감정을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짤 하나로 충분하다.
직장인 밈이 폭발적으로 퍼진 건 MZ세대가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입하면서부터다. 이들은 위계보다는 공감, 보고보다 대화에 익숙한 세대다. 하지만 여전히 조직 안에서는 감정 표현이 쉽지 않다. 상사의 눈치, ‘프로답게’ 보여야 한다는 압박, 끊임없는 업무와 메시지··· 이런 현실에서 밈은 안전한 유머의 방패가
된다. 비대면 업무 확산도 영향을 미쳤다. 카카오톡, 슬랙, 메신저 속에서 짤은 ‘감정의 단축키’ 역할을 한다. “회의 또 잡혔네 ㅋㅋ”와 같은 짧은 문장 대신, 드라마 장면 하나로 모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결국 밈은 말 대신 웃음으로 공감하는 디지털 직장인의 새로운 언어다.
직장인 밈의 핵심은 공감의 힘이다. 잡플래닛이 2024년 초 실시한 「직장인이 가장 공감하는 밈 Top 10」 조사에서는 ‘월요일 출근 밈’, ‘보고서 수정 밈’, ‘퇴근 직전 급톡 밈’ 등 상위를 차지했으며, 응답자의 92.3%가 “이런 밈을 볼 때 위안을 받는다”고 답했다. 누구나 겪는 장면을 포착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위안을 받는 것이다. 또한 직접적인 비판 대신 유머로 풍자한다. ‘팀장님이 말하는 잠깐의 시간감각’, ‘회의 끝났는데 다시 회의 잡힘’ 같은 밈은 현실의 부조리를 웃음으로 녹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짧고 빠르다. 3초 안에 웃기고, 기억에 남는다. SNS 알고리즘과 궁합이 좋은
덕분에 밈은 빠르게 확산되고, 누구나 쉽게 만들어 재생산할 수 있다. 결국 밈은 ‘웃픈 현실’을 나누는 디지털 유대의 매개체다.
밈은 단순한 유머가 아니라 현대 직장인의 감정 조절 메커니즘이다. 직접 말하지 못하는 피로, 불만, 체념을 유머로 가공해 사회적 언어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고단함’을 확인한다. 누군가의 짤에 웃을 때, 우리는 함께 버티는 동료가 된다. 결국 밈은 직장인의 자조가 아닌, 연대의 표현이다.